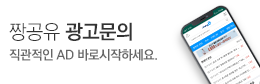[기적과 함께] - 2. 다시 태어나면 피레네의 소나 양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출발은, 첫발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실려 결코 가볍지 않다. 첫 한 걸음. 고작 그 한 걸음만 바닥에서 떼면 다음 걸음부턴 어렵지 않게 내디딜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결정은 늘 어렵다. 그렇다고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원인이 해소되어야만 첫발을 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발을 뗄 수 있는 원동력은 언제나 자신 안에 있는 용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연과 조우한 뒤 한 달. 걸음은 처음부터 그러기로 약속되었던 것처럼 이곳저곳을 돌아 자연스럽게 생장으로 향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청명한 하늘과 작렬하는 태양의 열기도 잊을 만큼 시원한 바람에 몸을 맡기며 막연히 서쪽을 바라봤다. 바욘에서 생장으로 오는 기차에서 만나 같은 알베르게에 묵었던 정수에게 듣기론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에서 피레네 산이 제일 높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상에서 그것도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서서 서쪽을 바라보면 산티아고가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리 집중을 해도 보이는 건 오로지 겹겹산뿐이었다. 행여 보인다 해도 그곳이 산티아고인지 내가 어찌 알겠나. 아, 바보……. 모질이도 이런 모질이가 없다. 무려 800km다. 800km 밖의 도시를 보려고 했다니……. 혼자만의 생각이니 누구도 알 리 없지만 괜스레 혼자 창피하다.
“Here, only Albergue?”
“Yes. #!#@%#& only Albergue.”
“10 Euro?”
“Yes. %@$%@$^!!#@ 10 Euro.”
“Ah… Ok. Comeback again.”
이 얼마나 실용적인 영어인가. 문법? 그런 거 모른다. 지역에서 유명한 꼴통 고등학교에서도 하위권 성적을 꾸준히 유지했던 내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는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도 되지 않는다. 그런 덕에 그가 하는 말 대부분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단어와 눈치로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은 찰나일 뿐 직면한 현실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인터넷에서 확인했을 때도, 파리 한인 민박집에서 만난 카미노 경험자 중년 남자도, 파리에서 바욘으로 가는 기차에서 만났던 정수와 사비나 아주머니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대부분의 알베르게는 5~7유로이고 가끔 조금 비싼 알베르게도 있으며, 수도원이나 성당에서 운영하는 곳은 정해진 가격 없이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생장을 출발해 6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첫 마을인 론세스바예스(Roncesballes)의 알베르게 안내소 탁자 위에 놓인 팻말에 적힌 숙박료는 무려 10유로였다.
무거운 걸음을 힘겹게 끌며 알베르게를 나와 빨래 건조대 옆 의자에 앉아 800km 밖 도시를 찾으려 했던 기발한(?) 두뇌를 열심히 굴리기 시작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까지 40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에서 그 40일을 버텨야만 한다. 수중에 있는 돈 280유로로 다른 여행은 고사하고 이곳에서 쓰기도 빠듯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빠듯한 돈으로 40일을 버티는 방법은 지극히 단순하고 무모했으며 미련했다. 숙박비 5유로, 1유로 바게트 한 개로 하루를 버틴다. 그래도 40일이면 240유로지만 간혹 정찰제가 아닌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알베르게에선 염치 불고하고 공짜로 묵어 돈을 아낀다면 산티아고에서 비행기를 탈 마드리드까지의 버스비 50유로를 남겨둘 수 있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도 힘든 계획이었지만 회사까지 때려치우고 온 마당에 5년 동안 일하고 받은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퇴직금에 쉽사리 손댈 수는 없다.
그런데 눈앞에 놓인 현실은 10유로의 알베르게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생장에서 묵은 알베르게 가격이 12유로였던 것도 부담이었는데 또 10유로라니……. 만약 듣던 것과 정보가 달라져 이 정도 지출이 계속된다면 퇴직금에 손을 대거나 계획된 일정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생장에서 받은 안내 용지를 꺼내 들었다. 생장 순례자 등록소에서 받은 종이는 총 세 장이었는데 순례 중 유의사항이 적힌 안내문과 생장에서 산티아고까지 34개 구간으로 나눈 구간별 지형지도, 그리고 각 마을 간의 거리, 알베르게 정보 등이 담긴 안내지였다. 행여 물에 젖을까 친절하게 지퍼백에 넣어준 안내지를 꺼내 다음 마을을 찾았다. 3km. 그리 먼 거리도 아니고 피곤하긴 했지만 못 걸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800km를 40일로 나누면 하루에 20km 정도밖에 걸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만 벌써 30km를 걸었으니 더 걸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고민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꼭 현명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고민이라는 깊은 늪에 빠지기 전에 배낭을 다시 어깨에 걸치고 일어나 몸을 돌렸다. 어떤 식의 결론이 나더라도 결국 오늘 하루 묵을 곳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더군다나 다음 마을까지 3km를 더 가서도 알베르게 요금이 똑같다면 계획한 일정까지 망가지는 셈이다. 사비나 아주머니와 정수도 이곳에 묵는다고 했으니 정보도 더 들을 겸 다시 만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의 결정에 애써 변명하며 알베르게 안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피레네 산을 넘으며 지나친 사람이 상당하긴 했지만 300명 수용이 가능한 이곳을 가득 메울 정도라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놀라운 건 그뿐 아니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 한 장만 두르고 돌아다니는 남자, 주변 의식하지 않고 상의를 갈아입는 여자, 큰소리로 대화하는 것도 모자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까지 남녀노소 인종을 불문한 다양한 행동에 30년 동안 쌓아온 기본 상식은 무참히 파괴됐다.
피곤함과 무료함에 짧은 낮잠을 취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소음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한 시간 정도 뒤척이다 결국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조금 전부터 들려오던 익숙한 말소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알베르게 뜰에는 예상대로 정수와 사비나 아주머니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시 만난 반가움과 순례길에서의 첫걸음, 피레네를 넘어 이곳까지 온 여정을 나누는 건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였다. 같은 길을 걸으며 비슷한 경험과 감정에 공감도 하지만 전혀 새로운 경험과 감정에 대해 듣는 것도 신선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고자 5시에 출발한 사비나 아주머니는 다행히 출발 직후 백인 노인 남자와 일행이 되어 어두운 숲을 안심하고 지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처음 만난 일행은 엉뚱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어둠이 걷혀 각자의 걸음을 걷자는데도 한사코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 일행을 자처하더니 발길의 흔적이 없는 땅을 지름길이라며 가로지르고 걷는 속도나 휴식도 본인 기준에 맞추기 일쑤였다. 인내력에 한계에 다다를 즈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느새 순례자들이 사라지고 사람의 흔적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길만 초라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분명 길을 잘못 든 것이다.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거꾸로 조금만 돌아가면 원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사비나 아주머니와 도리어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며 전진을 우기는 노인 남자의 의견이 대립했다. 서로의 의견을 주장했지만 일행의 고집을 꺾지 못한 사비나 아주머니는 결국 그와 1시간이 넘도록 엉뚱한 길 위에서 헤매야 했다. (먼저 출발한 그녀와 길 위에서 만나지 못한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다) 꾸준히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고집을 굽히지 않는 노인 남자에 의해 묵살되기를 반복하던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걸음을 달리했다. 그 결과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노인 남자는 사비나 아주머니가 이곳에 도착한 지 3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사비나 아주머니에게 호감을 느꼈던 걸까? 단순히 호감을 느낀 이성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과도한 호기였는지 모르나 그녀에겐 썩 훌륭한 기억은 못 돼 보였다. 첫날부터 의미 없는 고생을 한 그녀의 씁쓸함과 별개로 철없는 두 젊은 사내는 그가 그녀에게 반했기 때문이라며 놀려댔다.
생장에서 같은 알베르게에 묵은 정수는 아침 식사비용을 지불한 덕에 식사 시간까지 1시간이나 남아 같이 출발할 수 없었다. 아침 식사로 나온 보카디요(Bocadillo, 바게트 사이에 원하는 재료를 넣어 먹는 스페인식 샌드위치)를 처음 먹어봤는데 5유로나 주고 먹을 음식은 아니었다. 그래도 출발 전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기로 했다. 생장을 떠나 한껏 밝아진 세상을 걷자니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끊임없이 펼쳐졌다. 산봉우리만 남겨두고 부드럽게 흐르는 운해(雲海)와 한국의 가을이 생각나는 너무나도 맑고 높은 푸른 하늘, 처음 보는 다양한 꽃과 새소리, 한가롭게 풀을 뜯거나 휴식을 취하는 방목된 양과 소들은 모두 낯선 풍경이었다. 군대에서 읽은 책의 영향으로 제대 후 2달간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이 길을 선택했다.
기대에 가득 찼던 여행의 기대와 설렘은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첫날 산산이 부서졌다. 예약한 파리 민박집에 짐을 맡기고 에펠탑을 먼저 찾았다. 매체를 통해서만 접했던 에펠탑 전망대를 설레는 마음으로 올랐는데 그사이 가방에 넣어둔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여행자금 전부를 소매치기당했다. 유럽의 치안에 대해, 소매치기나 노상강도의 위험에 대해 전혀 몰랐던 탓에 방심한 것이 원인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영사관에서 일정 금액을 빌릴 수 있어 여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어렵게 온 순례길은 첫날부터 엄청난 감동을 선사해 줬다.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진 않아도 스치는 사람 모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짧은 인연이었지만 백인 노인 남자와 발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며 걷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산 위에 도로 따라 걸을 때 소하고 양 방목해 놓은 거 보셨어요? 저 거기서 혼자 한 시간은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죠? 양 목에 달린 종이요. 맞다. 워낭. 게네들 움직일 때마다 워낭소리 울리잖아요. 그게 산속에서 되게 작게 메아리쳐서 울리고 자동차는 거의 안 다니고 가끔 지나는 순례자들만 있어서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그 고요함이 되게 평화롭고 편안한 거예요. 한가롭게 풀 뜯는 양이나 소 보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일찍 도착하려고 서둘러 걷는 게 한심스럽기도 하고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 그냥 앉아있었어요. 한참 그렇게 짐승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피레네의 소나 양으로 태어나자.”
장난스러운 그의 표정과 말투에 소리 내어 웃었지만 십분 공감이 되는 얘기였다. 여유.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 가지지 못한 자가 여유를 논하는 건 나태, 포기, 거만, 사치 등이 그 뒤를 따르며 훈계의 대상이 되겠지. 나만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할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해 보면 그리도 남에게 관심이 많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한국 사람 누구도 내게 여유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부모, 선생, 선배, 꼰대… 누구도 여유나 휴식의 필요성이나 그 방법에 대해 알려준 적이 없다. 그들 역시 여유가 낯설었으리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기에 알려줄 수 없었겠지.
산을 오르며 또래의 한국 여자를 만났다. 비슷한 시간에 출발했지만 그녀는 생장에서 8km 떨어진 오리손(Orison)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두 시간 뒤에 마주친 것이다. 그녀의 걸음이 느리기도 하지만 똑같은 두 시간 동안 8km를 더 걸은 셈이었다. 흐뭇했다. 16kg이나 나가는 배낭을 메고 빨리,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내 걸음이 뿌듯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론세스바예스까지 향했다. 앞선 순례자를 지나치며 인사한 적은 있어도 날 앞지르며 인사하는 순례자를 본 적은 없었다. 숙소에 도착해 샤워와 정비를 마치고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지나쳤던 순례자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며 기분이 으쓱해졌다. 마치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처럼 으스대고 있었다. 평화롭고 한적한 여유 속에서 아름다움에 취했다 생각했던 오늘 걸음은 고작 그 정도였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바쁘게만 달려온 습관 탓이라고 하면 변명이겠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유를 즐길 준비도 연습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당장 내일부턴 빨리 걷는 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 하루 20km. 오늘 걸음을 생각하면 4시간도 안 걸릴 텐데. 차라리 산티아고가 1000km 밖에 있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할 텐데……. 아차차,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익숙지 않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건 역시 쉽진 않다.













역시.. 처음 걸을 때와 3년 후 걸을 때의 사진이 섞여 있습니다.
 도리돌2의 최근 게시물
도리돌2의 최근 게시물